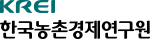|
KREI 논단| 2013년 2월 19일 |
김 정 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귀농인이 지역 공동체에 융화되도록 정책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 귀농인(도시민)과 농촌 주민을 확실하게 분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귀농인(도시민)은 A라는 덩어리에 속한 존재이고, 농촌 주민은 B라는 덩어리에 속한 존재이다. A와 B는 다르다. 그 사이에 견고한 분할선이 있다. 그렇게 나눈 다음에 A더러 B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할 것이다. 드물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발상은 좋게 말하면 표피적인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폭력적일 수 있다.
귀농인과 농촌 주민 사이에 과연 그렇게 ‘견고한 분할선’이 있는가? ‘갑’이라는 귀농인이 있다. 그는 40대 후반이고, 남자이고, 대졸자이고, 1년에 4,000만 원을 벌던 사람이고, 술을 적게 마시고, 두 아이의 아버지이고, 정치에 관심이 없고, 종교가 없다. ‘갑’이 이사해 온 마을에 ‘을’이라는 토박이 농민이 있다. 그는 50대 초반이고, 남자이고, 고졸자이고, 1년에 3,600만 원을 버는 사람이고, 술을 적게 마시고, 한 아이의 아버지이고, 정치에 관심이 없고, 종교가 없다. ‘갑’과 ‘을’ 사이에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아 보인다. 그런데 정책 프로그램이 ‘갑’과 ‘을’을 ‘견고한 분할선’으로 떼어 놓을 때, 둘 사이의 차이가 실제 이상으로 부각된다. 도시에서 살던 사람과 농촌에서 살아 온 사람의 몸에 배인 생활양식에는 차이가 있게 마련이지만, 그 차이를 정책 프로그램으로 없앨 수 있는가?
귀농인과 토박이 주민을 가르는 분할선은 그리 견고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유연하고 모호한 점선일 수 있다. 물과 기름처럼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모호한 경계선에서 입자들이 진동하고 서로 섞이는 것과 같은 변화가 귀농인의 정착 과정이다. ‘도시민’ 아니면 ‘농촌 주민’이라고 확실하게 분할하기 어려운 지점에서 섞임이 일어나고, 그 섞임과 배치가 어떤 새롭고 긍정적인 상태를 생성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귀농이라는 특별한 사회 현상에서 찾아야 할 희망의 내용이 아닐까?
얼마 전 라디오에서 어느 시인이 ‘좋은 교육은 아이들이 마음껏 놀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왜? 놀이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란다. 아이들이 마음껏 놀면서, 자신과 다른 상대방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란다. 함께 놀면서 ‘놀이의 규칙’을 새롭게 만들어 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함께 놀아야’ 할 사람은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아닐까?
농촌 토박이 주민에게 귀농인은 남이다. 타자(他者)이다. 귀농인에게 토박이 주민도 타자이다. 타자란 그저 ‘나와 차이점이 있는 이’라는 뜻이 아니다. ‘나와 다른 규칙을 갖고 사는 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타자는 때때로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내게 손해를 끼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와 규칙을 달리하는 그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 규칙을 만드는 놀이를 함께 한다’는 것은 타자와의 마주침을 피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갑’과 ‘을’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갈등이나 불화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갑’과 ‘을’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서로 규칙을 달리하는 이들이 상대방의 ‘얼굴’을 마주보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나가지 않을 때 반목과 불화가 생기는 것이다. 아니, ‘얼굴’을 마주보는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다툼은 필연일 수도 있다. 다투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저 친구는 나와 다른 족속이야’라고 생각하면서 데면데면하게 거리를 두고 뒤에서 쉬쉬하는 가운데 따돌리는 것이다. 이 경우는 상대방을 타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나와 다른 이’, 즉 이자(異者)로 이해하는 것이다. ‘타자’는 ‘나와 규칙을 달리하되 그 얼굴를 마주보는 자’이며, ‘이자’는 ‘나와 차이점이 있어서 거리를 두고 지내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귀농한 도시민이 어떤 시골 마을에서 ‘이자’로 존재하는 한, 그나 토박이 주민에게나 좋을 리가 없다. 귀농인에게 마을 사람들은 ‘타자’이어야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귀농인은 ‘타자’이어야 한다. 그래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살갑게 지내기도 하면서, 결국 ‘엉겨붙어야’ 한다.
의도적이고 도구적인 관점에서 전개하는 정책 프로그램으로는 귀농 현장에서 일어나는 반목과 불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대개 당사자가 아닌 이들이 사전에 설계하여 위에서부터 내려 꽂는 명령어에 불과하다. 그런 프로그램은 A와 B의 차이점을 필요 이상으로 부각시키고, A와 B의 차이점을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결국 A와 B가 섞여 새로운 C라는 존재들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작해야 작위적이고 어색한 시도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귀농 정책’이 필요 없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농촌에 살기를 원하는 ‘도시민’이 과도기적으로 ‘귀농인’이 되었다가 ‘농촌 주민’이 되도록 돕는 정책을 ‘귀농 정책’이라 한다면, 정책으로 개입해야 할 일들이 있음은 분명하다. 귀농하려는 도시민들에게 예고된 어려움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보, 지식, 이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농촌 지역사회가 새로운 구성원을 받아들여 건강한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다. 하지만 지금 우려되는 것은, 엉성한 프로그램들과 자꾸 시골로 이사가라는 독려의 과잉 속에서 ‘농촌 주민과 귀농인이 얼굴을 마주하는 장면’이 실종될 기미가 보인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