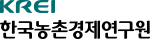| 한국농어민신문 기고 | 2016년 11월 25일 | 김 정 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연암(燕巖) 박지원 선생은 중국의 문물을 접한 이야기를 열하일기(熱河日記)에 남겼다. 말로만 듣던 코끼리를 선생이 직접 구경한 이야기도 나온다. “코끼리의 코를 입부리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다시금 코 있는 데를 따로 찾아보기도 하는데 그도 그럴 일이, 코 생긴 모양이 이럴 줄이야 누구나 뜻도 못했던 까닭이다.
더러는 코끼리 다리를 다섯이라고도 하고 눈이 쥐눈 같다고도 하는데, 이것은 대체로 코끼리를 볼 때는 생각들이 코와 어금니 어간에만 주목하는 까닭이다.” 코끼리를 둘러싸고 갖은 이설(異說)이 나오는 것을 비평했는데, 사람들마다 어느 한 부분만을 중시하면서 설핏 보고나서 하는 말들이 제 각각이라는 것이다.
각자 부분만 보고 주장 제각각
‘농업의 6차산업화’라는 말을 둘러싼 풍경이야말로 연암 선생이 경험한 ‘코끼리 소문’의 풍경과 같은 꼴이다. ‘6차산업화’라는 말이 몇 년째 온갖 설(設)을 분분하게 흩뿌리며 위세를 떨친다. 6차산업화야말로 농업·농촌의 활로라는 주장이 흔하다. 농정 예산을 논의하는 곳에서는 ‘6차산업화’라는 말을 끼워넣어야만 유리할 것 같은 분위기다. 사람들은 6차산업화를 외치며 앞으로 앞으로만 달려간다.
그런데 ‘6차산업? 그게 무엇인고?’라는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 파란 하늘에 ‘1차×2차×3차=6차’라는 단촐한 등식만 펄럭일 뿐이다. 구구한 설들을 ‘경영다각화설’, ‘기술융복합설’, ‘제휴협력설’ 정도로 압축할 수 있겠다.
경영다각화설은 ‘6차산업화’라는 말을 ‘범위의 경제’로 이해하는 주장이다. 범위의 경제란 생산요소들의 기능을 조절하여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뜻한다. 젊은이와 노인이 저마다 농기계를 갖고 작은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젊은 농민이 딱 필요한 만큼의 농기계를 운전하여 마을 전체의 농작업을 수행하고 다른 이들은 농식품 가공, 농촌관광,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 농작업 등에 종사하면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마을영농(혹은 집락영농)’이다. ‘6차산업화’를 ‘경영다각화’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제시하는 사례다.
그런데 ‘농업만으로는 돈 나올 곳이 없으니 가공도 하고 관광도 하자는 것이 6차산업화’라는 말을 간혹 듣는다. 어떤 이는 홀로 용감하게 농식품가공 부문에 뛰어들 생각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것이 6차산업화라면, 말이 안 된다. 농사짓는 것만 해도 힘든데 무슨 가공이며 무슨 관광인가?’라는 비판도 나온다.
‘1차×2차×3차=6차’ 등식만 펄럭
‘6차산업화’를 ‘경영다각화’로 해석하는 것에 동의하더라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생산요소들을 재배치하는데 전제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 앞서 예로 든 ‘마을영농’을 실현하려면 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주민들의 합의다. 전체의 효율을 높이려면 누군가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역할을 맡아야 한다. 그렇게 해도 본인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예상이나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주민들이 마을을 하나의 경영체로 재구성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둘째는 농기계 이용 효율화로 얻은 노동력을 활용할 기회다. 젊은 농민에게 농기계 작업을 몰아준 이들이 농식품 가공, 농촌관광 등 다른 종류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휴 노동력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농업생산 외의 ‘다른 경제활동’ 기회가 농촌 마을마다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대개는 가공 혹은 관광 부문 창업을 시도해야 할 터이다. 리스크(risk)가 따른다. 경영다각화로서 6차산업화, 개별 농가 수준에서 쉽게 시도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에서 추진하더라도 기존 생산요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묻지마 가공’으로 귀결되면 위험하다.
6차산업화 논의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기술융복합’이다. 디지털 기술 융합(convergence)이라는 용어에서 유래한 듯하다. 하나의 기기나 서비스에 여러 정보통신기술이 만나서 구현되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인 통화 기능뿐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 MP3, 방송, 금융 기능까지 갖춘 휴대전화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6차산업화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곳곳에 흔적을 남기고 있다. ‘기술사업화 지원 및 농업기술뱅크 구축 등 R&D 지원 확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등 정부 계획에서 발견되는 숱한 언표들에 녹아 있다. 서로 다른 부문의 기술이 접합되는 곳에서 6차산업의 꼬투리를 발견할 수 있음을 애써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기술들의 접합(또는 융복합이라고 하든, 무엇이든)에만 주목해서는 ‘6차산업화론’의 본래 취의(取義)를 살리기는 어려울 듯하다. 기술보다 사람들이 먼저 ‘융합’되어야하기 때문이다.
6차산업 다른 이름은 ‘소통·협력’
6차산업화의 등식에서 알짬은 곱하기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시너지(synergy)라 할 수 있다. 갑, 을, 병이 제 각각 이루어 낸 성과를 모두 더한 것보다 더 큰 성과를 갑, 을, 병이 ‘함께 함’으로써 이루어낼 때 시너지가 있다고 말한다. 각자의 사업 영역에서 활동하던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등의 종사자들이 사업을 ‘함께 함’으로써 더 많은 부가가치 또는 더 많은 고용을 거두게 하자는 것이 6차산업화를 ‘제휴협력’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그 ‘함께 함’이란 동종(同種) 혹은 이종(異種) 부문 종사자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공동으로 특정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협의회, 전략적 제휴 관계, 사업자들의 협동조합, 관계적 거래 등 여러 형식이 있을 수 있다. 여럿이 모여 의사 결정하는 데에 수없이 많은 대화, 설득, 언쟁, 오해 등이 수반될 것이다. 형제지간에도 동업은 하지 말라는 속담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그렇게 힘겨운 ‘함께 함’의 과정을 거쳐야 기술 융합에 따른 신상품도 나오고, 생산요소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새로운 시장도 열리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 6차산업화의 요체는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 조직들, 단체들 사이의 연대, 제휴, 협력, 공동의 이익 추구, 대화 등에 있다.
6차산업화의 다른 이름은 ‘소통과 협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