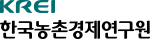|
세계일보 기고 | 2007-09-29 |
최 정 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오십대 ‘낀세대’들이 기억하는 어릴 적 추석은 평소 구경하기 어려운 고깃국을 먹고, 머리맡에 두고 잔 새 신을 신고 성묘를 가던 모습일 것이다.
요즘 어린이들은 교통체증 속에 시골 할머니 댁에 가서 차례를 모시고 돌아온 일이 기억에 남을 듯하다.
예년보다 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왔다. 귀성했던 많은 사람들은 고향의 부모님과 동네 어르신들의 주름진 얼굴과 어려운 삶을 답답한 심정으로 떠올리고 있을 것이다.
다음 세대의 추석이 어떤 모습일지 가늠하기 쉽지 않지만 대규모 귀성 행렬은 점차 없어지지 않을까 싶다.
동양 3국 중 우리에게만 있는 추석은 농경사회의 흔적이 가장 뚜렷이 남아 있는 명절이다. 청명한 가을에 수확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조상께 감사드리기 위해 햅쌀로 밥을 짓고 술을 빚어 가족과 이웃이 모여 흥겹게 어우러졌다. 요즘도 추석 선물로 농수산물이 대종을 이루는 것을 보면 이런 전통이 살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이면에서는 농업의 상대적 축소와 대규모 이농이 지속되었다. 농사짓던 부모 세대는 남고 자녀는 취직이나 진학을 위해 농촌을 떠났다. 그 결과 1975년부터 2005년 사이 전국 인구는 1300만명 증가한 반면에 농가인구는 1000만명 감소하였다.
농가의 자녀나 귀농인에 의한 영농 승계와 창업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농가인구의 고령화는 우리 사회 전체보다 약 30년 앞서 진행되고 있다. 귀성 행렬과 교통체증도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까마득한 옛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
거대한 힘으로 전개되는 세계화는 농산물 수입국에 농산물 시장 개방과 경쟁의 심화를 의미한다. 그러다 보니 수입 농수산물이 없이는 차례상 차리기도 어렵게 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농업의 기본 역할은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농업은 국토환경을 관리하는 다원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은 교역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 농민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직접지불’ 정책은 국제적으로도 허용되어 있다.
산업화를 넘어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는 시대에 직불제만으로 농업을 유지할 수는 없다. 생산만 하면 소비되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던 농경사회의 원리이며, 이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농식품을 만들어 공급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추석은 미완의 축제이다. 생산은 마케팅의 출발점에 불과하므로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의 식탁에서 승부가 결정된다.
시대 조류와 함께 가는 농업인은 ‘농업생산자’를 뛰어넘어 논밭에서 나는 농산물을 원료로 삼아 고부가가치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농업경영인’으로 변모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농업생산 과정 자체를 상품화하는 첨단 농업경영인까지 나타났다.
농가소득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생활과 교육 환경이 열악하여 농업에 종사할 인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미래 농업의 비전을 보여주고 농촌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정책 의지를 실천한다면 영농 승계뿐 아니라 신규 취농과 귀농도 늘어날 수 있다. 이때 농업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서 농업 종사자가 당당한 직업인으로 대우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또 시장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경쟁 자체가 어려운 농촌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적 배려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 국민 모두가 웃는 온전한 추석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