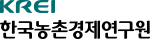

|
‘칠순 새댁’이 경로당에서 밥 짓는 농촌
278
|
||||
|---|---|---|---|---|
| 기고자 | 김정섭 | |||
여름철 큰비에 ‘아이고, 큰일 났다’고 떠들며 걱정한다고 비가 갑자기 멎을 리 없다. 방 안에 들어앉아 근심으로 시간을 보내느니, 집 주변에 무너질 만한 장소나 곳간에 썩을 만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조치하는 게 현명하다. 연일 매스컴에 등장하는 저출산·고령화 이슈와 함께 터져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딱 그런 꼴이다. 출산을 장려하고 귀농·귀촌을 촉진해야 하겠지만, 그것으로 농촌의 인구 감소 추세를 멈춰 세울 수는 없다. 기껏해야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으면 다행일 테다. 인구가 줄어 문제가 생기니 인구를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발상은 옳은 듯하지만, 그렇지 않다.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생기니 비가 그만 오게 하자’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인구는 늘리고 싶다고 해서 금방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가까운 장래에 인구 과소화·초고령화 농촌 지역사회에 남아 살게 될 사람들의 삶의 질 문제에 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삶의 질 문제는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얼마나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환언(換言)할 수 있다. 시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 부문, 가족이나 마을 같은 공동체가 개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는 주된 경로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인구가 줄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 농촌에서는 시장이 소멸하는 중이다. 인구 3000명 이하 면(面) 지역들의 중심지는 ‘중심’이라는 말이 민망할 정도로 상권이 붕괴했다. 변변한 음식점이나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도 없는 곳이 허다하다. 약국이나 세탁소는 찾아보기가 더욱 어렵다. 공공 부문은 어떠한가? 학생 수가 줄어 초등학교, 중학교 등이 폐교하는 사태는 30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의사 자리는 공중보건의 제도로 겨우 땜질하는 형편인데, 위태롭다. 요즘에는 경찰도 재정 효율성을 이유로 인구가 적은 면 지역의 치안센터를 폐지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우체국도 문을 닫으려는 곳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족이나 마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농촌 마을에 노인 독거 가구 비율이 빠르게 높아졌다. 나이 칠십 넘은 노인이 경로당에서 더 늙은 노인 여럿의 끼니를 챙기려고 밥 짓는 풍경이 드물지 않다. “제가 올해 57살인데 마을에서 가장 젊어요. 아직도 마을에선 새댁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농촌에서 만난 여성 주민의 말이다. 정말로 걱정되는 건, 그이가 칠순이 되어도 여전히 ‘새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다.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인구가 줄면 사라질 것은 사라지는 게 당연하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그러게 불편하면 도시에서 살 것이지, 시골에서 살라고 누가 강요했나?”라며 농촌 주민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트집을 잡는 고학력 전문가를 만난 적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작 진지하게 따져보지 않는 문제는 ‘사라져도 당연한 것은 무엇이고, 당연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기업의 수익성이나 정부 재정 투입의 가성비가 ‘인구 감소 시대에 남길 것과 버릴 것’을 판단하는 최상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농촌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사회적 약자에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흘러가던 모든 나랏돈의 쓸모가 의문시될 것이다. 돈 잘 번다는 케이팝을 제외한 다른 분야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도 명분이 없을 것이다. 학교, 어린이집, 보건의료, 치안,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등을 정부가 무조건 풍족하게 농촌 주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게 아니다. 인구 과소화·초고령화에 대비하는 농촌 주민 삶의 질 문제에 관한 정책 판단이 가벼울 수 없음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된다/안 된다’의 단순한 이분법을 떠나 제3의 해법이나 타협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글에서 상설하기는 어렵지만, 비용효율이 낮아 제공되기 어려운 재화나 서비스를 농촌 지역사회 주민들이 공급·전달하게 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폭넓게 모색해야 한다. 서둘러야 한다. 그나마 ‘일할 사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없는 돈을 농촌에 퍼주자는 것 아니냐”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이건 경우가 다르다. 지역사회의 주민이 능동적으로 스스로의 필요를 해결하려 움직일 때 그 효율이나 효과는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이 여러 선구적 사례에서 밝혀진 바 있다. 게다가 100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 철도를 지하화하겠다는 나라에서, 주민 삶의 질에 긴요한 필요에 대응하려는 정책에 돈을 쓰는 게 아깝다고 하면 그건 너무하지 않은가? |
||||
| 파일 | ||||